등록 : 2015.08.18 16:22
수정 : 2015.08.18 18:41
윤형중 기자의 풀카운트
많은 야구선수들의 꿈은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다. 지난 17일 장충고의 외야수 권광민은 12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다. 권광민은 “어려서부터 꿈이 메이저리그였다. 3년 내에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권광민의 선전을 기대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바로 건너간 야구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야구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단 두명이다. 바로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간 강정호와 류현진이다.
1994년 한양대 재학 중이던 박찬호의 엘에이 다저스 입단을 시작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야구선수는 총 59명이다. 이 중 한국 프로야구 출신의 구대성, 이상훈, 윤석민 등을 제외하면, 고교와 대학에서 미국으로 직행한 야구선수는 48명이다. 그나마 1990년대에 미국에 진출한 김병현(성균관대), 김선우(고려대), 봉중근(신일고) 등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약했지만, 2000년부터 미국에 진출한 아마 야구선수 31명 중에는 추신수와 류제국을 제외하면 아무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다. 유일한 성공사례인 추신수도 2000년에 시애틀에 입단해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되는 2008년까지 무려 8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다. 한국에서 데뷔했어도 포스팅(공개 입찰)이나 자유계약(FA)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한국 아마 출신의 선수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한 고교 야구감독은 “미국 마이너리그는 한국 프로와는 달리 선수의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대 선수를 상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통이 어렵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선 프로에 지명되면 최저연봉인 2700만원이 보장되지만, 마이너리그에선 이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다. 한국과는 달리 숙식 비용을 선수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싱글과 더블A를 거쳐 트리플A에 진출해서도 부상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엘지의 에이스 류제국은 덕수정보고 재학 중인 2001년 16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다. 그는 루키리그부터 시작해 한해한해 성장하며 트리플A까지 올라갔으나, 팔꿈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국내에 귀국해 공익근무로 병역을 해결한 뒤 2013년부터 엘지에서 활약했다.
야구선수로서 더 큰 무대를 꿈 꾸는 것을 말릴 수 없다. 하지만 류현진과 강정호의 성공사례를 보면,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서도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 프로야구는 올해부터 10구단 체제를 갖췄다. 선수를 필요로 하는 팀이 많아졌고, 경기 수도 126경기에서 144경기로 늘었다. 연 관객 800만명을 목표로 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는 경기력 향상과 새로운 선수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흥행을 이끄는 스타 선수에 대한 갈증이 크다. 올 시즌 삼성의 구자욱, 넥센의 김하성이 나오지 않았다면, 신인왕 경쟁이 이목을 끌 수 있었을까. 지난 15년간 미국에 진출한 아마선수 31명 가운데 구자욱, 김하성만큼의 자질을 갖춘 선수가 없었을까. 올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 진출이 유력한 박병호는 이적료만 1000만 달러(약12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병호는 지난 4년간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을 이끈 동시에 자신을 키운 팀에도 거액의 이적료를 남기는 셈이다.
강정호와 세 살 차이인 이학주는 충암고 졸업반이던 2008년 115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다. 지금은 템파베이의 트리플A에서 유격수로 뛰고 있다. 2013년에는 팀내 최고 유망주 대우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내내 마이너리그에서 타율이 2할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이학주는 고교시절 동갑내기 유격수 5인방인 김상수, 안치홍, 허경민, 오지환 등과 경쟁했다. 이학주를 제외한 네 선수 모두 한국 프로야구에서 주전이자 주축 선수로 자리잡았다. 이학주의 도전은 아직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학주, 권광민과 같은 아마 출신의 유망주들이 국내 프로야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국내에서의 성공을 발판삼아 해외에 진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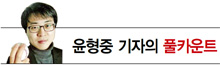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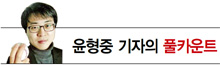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